❝
떡메로 치는 인절미는 주식이자 다과,
제물이자 혼례 음식으로 떡의 흐름을 대변한다.
❞
천연 발효, 방부제와 인공감미료 무첨가 등 어디든 웰빙 홈메이드 디저트가 즐비한 시대. 하지만 재료 준비부터 완성까지 일일이 손품을 팔던 과거엔 떡 한번 해먹기도 만만치 않았을 테다.
그럼에도 경사스러운 날 떡을 나누며 동네잔치를 벌인 선조들. 그중 떡메로 치는 인절미는 주식이자 다과, 제물이자 혼례 음식으로 떡의 흐름을 대변한다. 요기조기 콩고물처럼 붙은 소박한 풍요. 쌀의 맛있는 일탈, 인절미를 따라가 본다.
♣ 아껴둔 곡식을 빻아 재료 준비 시작
디딜방아는 발로 디뎌 곡식을 찧는 방아.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연자방아나 물레방아를, 대개 시골 농가에선 디딜방아를 썼다.
방아 찧는 일은 주로 부녀자가 맡았는데 곡식을 거피가 붙어 있는 채로 저장했다 필요할 때마다 찧어 밥이나 떡, 술 등을 해 먹었다. 디딜방아를 언제 처음 사용했는지 알 순 없지만, 고구려 안악 제3호분 벽화엔 디딜방앗간의 한 장면이 또릿하게 그려져 있다.
또 고구려의 건물 터로 밝혀진 경상북도 문경시 상초리의 전조령원지에서도 부엌 한쪽 벽 바깥으로 설치된 디딜방아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그림 「방아 찧는 모양」 김준근(金俊根), 19세기 말
그림 「방아 찧는 모양」을 찬찬히 보면 다섯 여인이 힘을 모아 곡식을 찧는 데 심취해 있다.
19세기 말 개항장에서 활동한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金俊根)의 작품으로 그림 속 인물은 넓으면서도 튀어나온 이마, 눈 주위 검은 달무리, 갈고리 코 등 디테일한 개성으로 묘사됐다. 여기에 명암을 도식화한 의복은 이중 윤곽선 묘법으로 표현, 생동감 있는 움직임 너머 가빠지는 숨소리마저 들리는 듯하다.
디딜방아는 한 사람이 딛고 한 사람이 께끼거나, 두 사람이 딛고 한 사람이 께끼는 두 가지 형태. ‘두 사람이 딛는 방아’의 채는 길고 뒤 뿌리가 제비꼬리처럼 좌우로 갈라졌다.
반면 ‘한 사람이 딛는 방아’의 채는 짧고 가늘다. 그림 속 디딜방아는 뒤 뿌리가 좌우로 갈라져 두 여인이 각자 중심을 잡으려는 듯 천장에 달린 줄을 잡고 방아채를 밟고 있다. 이때 방아채를 디뎠다 얼른 놓는 사이 공이가 내리쳐지며 왕겨가 스르륵 벗겨진다.
하나 된 호흡으로 앞쪽 여인은 곡식이 골고루 빻아지게 뒤섞으며 한 손엔 빗자루를 든 채 밖으로 튀어나온 알갱이를 추스른다.
선조들은 곡식이나 떡을 찧을 때뿐 아니라 고추를 빻고 메주콩을 이기는 데도 디딜방아를 썼다.
특히 추운 북쪽이나 도서 지역은 부엌 귀퉁이에 따로 벽을 쳐 방아를 설치해 신주단지 모시듯 다뤘다. 밥 같은 주식은 물론 부식, 다과 등을 준비한 디딜방아. 쿵덕쿵덕 정겨운 리듬 너머 노곤함이 스민 정성이 보인다.
♣ 떡매질로 차진 인절미의 역사
통나무 떡판(안반, 案盤) 앞 여인네가 떡을 고르고 두 장정이 떡을 친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며 구수한 쌀향이 콧속으로 배어들 때 차진 떡이 맛깔나게 완성된다.
단 세 명의 합이 맞아야 방망이에 떡이 달라붙지 않고, 오래 내리쳐야 떡 속에 공기가 빠져 쫄깃한 식감이 살아난다.
▲ 그림 「떡매질」 김준근(金俊根), 19세기 말
쪼그려 앉아 연신 떡에 물을 뿌리며 뒤적이는 건 여인네 몫. 그림 「떡매질」에선 정점에 오른 찰기가 손끝에 전해진다. 칠을 하지 않아서인지 활달한 필선이 더욱 도드라져 가만히 보고 있자니 침이 꼴깍 넘어간다.
우리나라에선 떡의 기원을 원시 농경에서 찾을 만큼 유구한 역사를 가졌다. 낙랑 유적의 청동제 시루와 토기 시루, 삼국시대 고분의 시루뿐 아니라 고구려 안악 3호분의 동쪽 방에도 떡 찌는 시루로 보이는 큰 항아리가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도 떡 이야기가 등장해 흥미롭다. 특히 양곡이 증산된 고려시대 후엔 떡의 종류가 풍성해져 다과 문화를 화려하게 꽃피웠다.
이때부터 떡은 서서히 절식의 주인공으로 안착했는데,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활동한 이색의 문집 『목은집(牧隱集)』엔 유두일에 먹는 단자병과 점서(粘黍, 찰기가 있는 기장)가 시구에 나타난다.
또 조선시대 최초 백과사전 『지봉유설(芝峯類說)』을 보면 ‘고려에서 상사일에 쑥떡을 으뜸으로 삼았다’는 내용도 살필 수 있다.
❝
‘연안 인절미’는 진품 찹쌀만을 써 곱게 가루를 내어 찌는데,
‘많이 치는’것이 연안 인절미의 천하제일 비법이었다.
❞
안반에 쳐서 만든 떡(도병, 擣餠)은 흰떡과 절편, 개피떡 등으로 다양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건 역시 인절미. 고려 때 제사식(祭祀食)에 수록된 인절미는 떡 중의 떡으로 오랜 역사를 드러낸다.
▲ 규합총서(閨閤叢書) 빙허각이씨 저 / 윤숙자 역
특히 조선에선 황해도의 ‘연안 인절미’를 일미로 꼽았는데, 『규합총서(閨閤叢書)』는 “연안 것이 나라 안에서 제일이니, 만드는 법을 보면 찹쌀을 멥쌀 하나 없이 가려 더운물에 담가 날마다 물 갈기를 사오 일 동안 한 후 건져내 무르녹게 찐다.
그런 다음 오래 치는 것이 좋다. 대추를 가늘게 두드려 떡을 칠 때 넣고, 볶은 팥을 묻혀 굳힌다”고 상세히 풀어놓았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은 “연안 인절미는 진품 찹쌀만을 써 곱게 가루를 내어 찌는데, 많이 치는 것이 좋다”며 천하제일 비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인절미는 이두(吏讀), 인절병(印切餠), 인절미(引截米) 등으로 불리는데 ‘잡아 당겨 자르는 떡’을 뜻한다. 이름에 얽힌 비화 하나도 재미있다.
조선 인조 때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이 반란군에게 점령당하자, 인조는 공주의 공산성으로 피란을 떠났다.
그곳에서 임씨 성을 가진 농부가 찰떡을 바쳤는데, 맛이 워낙 좋고 처음 맛본 떡이라 신하들에게 그 이름을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임 서방이 절미한 떡이라 ‘임절미’로 칭한 것이 오늘날 인절미로 바뀌었다고 한다.
❝
최근엔 떡보다 콩고물이 더 인기를 끌어
서양식 디저트에도 ‘인절미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
조선 중기 인절미는 9월 중양절(음력 9월 9일)의 제물로도 쓰여 근대로 접어들면서 추석 전후 음력 8월에 많이 만들어 먹었다. 또 겨울엔 별미로 인절미를 해두었다 기나긴 밤 출출할 때면 말랑하게 구워 꿀이나 조청, 홍시 등에 찍어 먹었다.
▲ 밀크 인절미 빙수
최근엔 주객이 전도된 건지 떡보다 콩고물이 더 인기를 끌어 서양식 디저트에도 ‘인절미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인절미 크림이나 인절미 티라미수, 콩가루 인절미 다쿠아즈, 인절미 쿠키 등이 그것. 특유의 쫄깃한 식감에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강조해 시대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고 있다.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떡 중의 떡, 인절미史
떡 중의 떡, 인절미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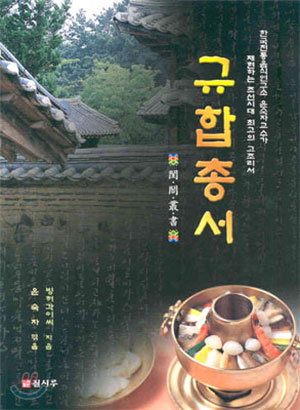


 •한식진흥원 •농촌진흥청 •농사로
•한식진흥원 •농촌진흥청 •농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