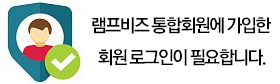♣ 조연옥 (1944년생 / 안덕면 서광리) 구술조사
어릴 적에는 말똥버섯이 참 많았다. 그 버섯을 따다가 후라이팬에 간장 조금 넣고 볶아서 먹으면 별미였다. 또 퐁낭에 버섯이 많이 붙어 있었는데 그 것을 따다가 죽을 쑤어 먹으면 맛이 있었는데 요즘 초기(표고버섯)보다 향도 진하고 맛도 좋았다.
들에 나가면 물자랑이(목이버섯)가 볼레낭(보리수나무)에 많았다. 그럼 그것을 따가지고 와서 깨끗이 씻어 말렸다가 저장음식으로 먹곤 했었다. 보양식으로는 닭엿이나 돼지고기 엿을 해서 남편이나 식구들 기운 없을 때 먹게 했다. 또 오합주를 담았는데 그 때는 술을 직접 집에서 담갔다.
보리를 거피하여 보리쌀을 하고 나면 그 찌꺼기가 남는데 그것을 긁어모아 누룩을 만들었다. 밥을 해서 따뜻할 때 누룩과 물을 넣고 놔두면 보글보글 괴다가(발효) 싹 가라앉는다. 그러면 윗물을 따라 내어 청주로 쓰고 나머지는 막걸리로 쓰는데 그 막걸리를 오합주 만드는데 사용했다.
오합주는 계란 노른자 30개, 꿀, 생강, 참기름을 넣고 서늘한 곳에서 발효시킨다. 그러면 기름이 둥둥 뜨는데 계란 노른자가 완전히 삭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다. 오합주는 일시적으로 기운을 돋우는 역할을 했다.
그때는 보양할 음식이 없어서 그렇게 먹었지만 지금은 워낙 먹을게 많아 이런 음식은 아마 먹지 않을 것이다. 애기 낳고 특별히 생각나는 건 배가 너무 아팠는데 어머니께서 청주에 꿀, 메밀을 타서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더라. 약이 없던 시절이라 그것을 두어번 먹으니 진짜 배 아픈 게 낫더라.
▲ 조연옥 씨
청주가 몸을 소독했는지 메밀이 피를 삭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민간요법 중의 하나였다. 결혼할 때는 사흘 전부터 돼지를 잡고 잔치를 했다. 신랑이 모슬포 군부대에서 트럭을 하나 빌려가지고 나를 데리러 왔더라. 분교학교에 태극기 그려서 붙여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잔치음식으로는 특별한게 없었지만 바닷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어서 그런지 국은 그 때도 먹었던 것 같다. 그 외 돼지 간을 사용하여 전을 부쳐서 먹는 정도였다. 새각시 상을 받으면 새색시 구경온 사람들에게 흰 쌀밥을 한 수저씩 떠서 주었다.
아마 새각시도 궁금했지만 쌀밥이 어려운 시절이라 쌀밥 한 수저 얻어먹으려고 했던 아이들이 더 많았던 것 같다. 잔치 부조는 보리쌀 한되를 구덕에 가지고 가면 다시 그 구덕에 보리밥 한 그릇을 답례품으로 준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었다.
제사 때 남자들은 대나무를 잘라 적꽂이를 만들어 화로에 숯불을 피우고 적을 구웠다. 메밀묵도 화롯불에 같이 구워 냈었다. 우리 동네는 목장지대여서 소고기나 말고기를 접할 기회가 많았었다. 말고기는 삶아서 썰어놓고 밀가루(또는 메밀가루)를 조금 넣고 푹 끓이면 말고기 탕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몇 날 며칠씩 먹곤했다. 또 말고기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금에 절였다가 겨울에 화롯불에 구어서 먹었다. 말고기는 제사 때는 먹지 않았다. 금기시 된 고기였다. 제주음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제주식 육개장이다.
돼지고기 뼈를 푹 고으면 살이 털털 떨어지는데 여기에 고사리, 생강, 마늘을 다져넣고 밀가루(다른 사람은 메밀을 쓰는데 나는 꼭 밀가루를 쓴다)를 넣고 조물조물 해서 넣어 끓인 후 내놓을 때 잔파를 썰어놓으면 좋다. 옛날 살아온 생각을 하면 그게 삶이었나 할 정도로 어려웠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 가끔 화날 때가 있다. 풍부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냥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 자료조사 팀 : 고복임, 김태자, 현옥자, 고영란, 강이선, 양춘선, 오정자, 이춘시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말똥버섯, 물자랑이 맛이 그립다
말똥버섯, 물자랑이 맛이 그립다
 •강원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향토음식연구회
•강원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향토음식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