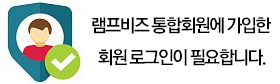♣ 김정숙 (1925년생 / 안덕면 서광리) 구술조사
내 친정은 안덕면 동광리다. 그 때는 정말 어려운 때라 아이들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도 큰놈, 샛놈, 작은놈, 딸도 큰년, 샛년, 작은년 이렇게 불리웠던 시절이었다. 특히 동광리는 땅이 그리 좋지 않아서 쟁기도 쓸 수 없었다.
그래서 따비로 밭을 갈아야 했고 곡식도 메밀 정도 갈아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사람이 죽으면 피력(부조)으로 메밀 돌레떡을 해가지고 갔다.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둥글게 만드는데 이때 가운데 는 좀 얇게 가에는 좀 두껍게 해서 물에 삶아 건져내서 돌레떡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든 돌레떡을 두개 붙이면 한합이 된다. 이런 돌레떡 피력도 각자의 몫이 있었다. 큰아들은 돌레떡 사십합, 둘째아들은 스물합 등.
그 당시 영장밭에 가면 밥 한그릇 겨우 먹고 돌레떡 하나씩 반(몫) 받아오는게 전부였다. 돼지고기는 제 지내는 상에 놓을 정도로만 있어서 조문객에게까지는 나눠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어릴 때 주로 먹었던 것은 모멀범벅(메밀범벅)이었다.
메밀에 감자(고구마), 식은밥을 넣고 쪄서 주식으로도 활용하고 간식으로도 먹었다. 그 때는 동냥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 어릴 때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밭에 가면서 모멀범벅을 많이 해 놓고 가면 동냥바치(동냥하는 사람)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무서워서 바구니째 주고 나면 먹을 게 없어서 어머니가 올 때까지 굶었던 생각이 난다. 또한 동광은 목장지대여서 말을 키웠다. 말이 병들어 죽으면 말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말고기는 특별히 요리해서 먹었다기보다는 오래 두고 먹으려고 소금에 절였다가 말려서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다.
동광사람들은 그 당시 주로 한림으로 장을 보러 다녔다. 한림에 가려면 아침 새벽(5시경)에 일어나서 걸어가야만 했다. 농산물은 콩, 메밀을 가져가서 팔았지만 동광은 주로 숯을 떼어다가 팔기도 했다.
어머니가 장에서 돌아올 때면 혹시나 보따리에 사탕이라도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어머니보다는 장바구니를 더 기다리기도 했다. 반찬은 별 반찬이 없었다. 지금 기억에 무는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배추는 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들무를 캐다가 소금에 절여서 김치로 먹었는데 고춧가루는 없어서 넣을 생각도 못했다. 들무는 재배는 안했지만 뜯어다 김치 로 담가서 먹기도 하고 씨는 기름으로 빻아서 먹었다. 그 때는 들무가 좋은 먹거리였다.
동광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산후 조리음식으로 모멀조베기도 먹었지만 청주, 꿀, 메밀가루를 타서 마시게 했다. 메밀로 궂은 피를 삭히고 청주로 소독을 시키는 의미였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나서 말똥이나 소똥으로 군불을 지 펴놓고 몸조리를 하게 했다.
동광리에서 열아홉살에 서광리로 시집을 왔다. 서광리는 땅이 좋아서 그런지 면네(목화)농사, 보리농사 등 다양한 농사를 하는 곳이었다. 일제 시대 때는 면네를 공출하였는데 할당량이 있어서 그것을 다 채워야만 했다. 만약에 채우지 못하면 돈으로 사서라도 공출 할당을 맞춰야 했다. 참 힘든 시절이었다.
또 감저(고구마) 빼떼기(절간고구마)도 공출량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술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전분을 만들려고 빼떼기를 공출했던 것 같다. 나중에 해방이 되어 일본군들이 돌아가면서 빼떼기랑 쌀 가마니를 화순바다 근처에 놓고 다 태우더라. 그것을 보면서 그냥 놔두면 우리라도 먹을건데 하는 생각에 정말 야속하였다.
기억에 남는 음식은 고구마 빼떼기를 갈아서 팥 좀 넣고 죽을 쑤어서 먹었던 음식이다. 지금이야 먹으라고 해도 잘 안 먹겠지만 그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것이라도 실컷 먹어봤으면 해서인지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음식이 되었다.
▲ 는쟁이범벅
그리고 는쟁이 범벅이 생각나는데, 는쟁이는 메밀을 거피하고 남은 메밀(메밀 쌀은 고급으로 해서 팔았다) 껍데기를 갈아서 체에 밭히면 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 는쟁이를 고구마 또는 톳하고 반죽을 해서 살짝 쪄서 먹었는데 이것을 ‘는쟁이범벅’이라고 했다.
잔치라고 별 다른 음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돼지고기에 국이나 끓이고 밥이나 먹었다, 그때도 돼지고기 삶았던 물에 몸을 넣어 몸국을 끓였던 것 같다.
잔치 때는 보릿대 꼬지에 고기두점, 메밀에 감자(고구마)놓고 지진 전하나, 그리고 두부하나 꽂아서 밥 위에 하나씩 놓으면 그것이 각자의 몫이었다. 멜은 국보다는 젓갈을 해서 먹었다.
웃드르인 서광리는 사계에 가서 멜을 사와야 했는데 하룻밤을 자면서 기다렸다가 멜을 사와야 했다. 교통이 불편해서 힘들었지만 멜젓 담그는게 장 담는 것 만큼이나 일년 반찬으로 소중했기 때문에 해야만 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아득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해서 낭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언짢을 때도 있다. 옛날 음식이라고 맛이 없지만은 않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그 음식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을까 한다.
* 자료조사 팀 : 고복임, 김태자, 현옥자, 고영란, 강이선, 양춘선, 오정자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서광리와 동광리 음식이야기
서광리와 동광리 음식이야기
 •강원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향토음식연구회
•강원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향토음식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