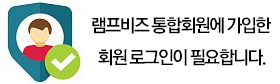♣ 고귀생 (1930년생 / 서귀포시 신효동), 현양아 (1947년생 / 서귀포시 신효동) 구술조사
옛날에 영장(초상)이 나면 솔변, 절변, 중괴, 약괴를 해서 상에 올렸다. 시루떡은 백시루떡을 올렸다. 팥은 사용하지 않았다. 적도 돼지고기 적을 했는데 있는 집은 소고기 적도 해서 올렸다.
국은 보통 생선 종류로 했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어랭이, 코생이 등 바다에서 나오는 것이면 가리지 않았다. 없으면 갈치도 국을 끓여서 올렸다. 떡은 방앗간이 없어서 말래를 사용해서 쌀을 빻았다. 말래는 동네마다 몇개씩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사용했는데 말래에 가서 보면 쌀구덕이 있으면 누가 사용하기로 했구나 하고 차례를 기다렸다. 영장이 나면 집에 있는 돼지를 잡았는데 손님이 많은 집은 다른 집의 돼지를 사오기도 했다.
돼지를 잡으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것이 ‘공정’이었는데 지관(묘터를 봐 주는 사람), 목시(묘를 파주고 관을 짜주는 사람), 솥밑할망(밥을 해주는 할머니) 몫으로 큰 차롱(바구니)에 갈비 한 대, 떡, 돼지고기를 담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말한다.
아마도 초상이 나면 가장 애쓰는 사람에게 따로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다. 옛날에는 초상이 끝나면 집에 ‘삼호제’라고 해서 삼일동안 제사를 지냈고 그 후로 상식이라고 해서 상을 차려놓고 아침점심으로 밥을 올렸으며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는 ‘삭망’이라고 해서 제사처럼 제를 지냈다.
형제가 많은 집은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했지만 자식이 많지 않은 집은 제사를 한달에 두 번 하는 격이었으니 참 힘들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다음 해는 소상, 그 다음 해는 대상을 치룬 다음에야 진짜 초상이 끝난 것이었다.
그 3년 동안에는 잔칫날 대반(신랑집을 대표하여 신부를 맞는 역할)이나 우시(사돈집에 가는 것)를 할 수 없었다. 제월전(제사 용으로 물려받은 땅)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집은 조그만 밭 하나 팔아야 할 정도로 초상이 나면 많은 비용이 들었다.
▲ 고귀생, 현양아 씨
감귤이 재배되기 전인 60년대 후반까지 신효에도 조, 보리를 재배했다. 조, 보리를 갈고나서 그 고랑사이에 콩을 하나씩 심어 장을 담가 먹었다. 푸른콩이었다. 푸른콩이 일반 메주콩보다 풀기가 많고 달착지근해서 장을 담그면 훨씬 맛이 있다.
나이가 든 지금도 장을 담가서 먹는데 내가 더 늙으면 누가 장을 담글지 걱정이다. 그리고 콩죽을 많이 해서 먹었는데, 콩가루로 죽을 쑤다가 쌀이나 무 등을 넣어서 먹으면 맛이 있었다. 반찬으로는 자리젓을 많이 먹었다. 또 자리젓은 물을 넣어 휘저은 다음 국물을 낸 후 나물 등을 넣어 국을 끓여 먹기도 했다.
또 주식으로 먹다시피 한 것이 고구마였다. 고구마를 쪄서 먹거나 범벅을 해서 먹거나 또 겨울에는 빼떼기를 해서 먹었는데 빼떼기는 물을 많이 넣고 당원(식품첨가물 일종)을 넣고 푹 삶으면 맛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원 맛이었던 것 같다.
특이한 음식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똥조배기’라고 고구마 가루를 조그맣게 해서 손으로 꼭꼭 쥔 다음 끓은 물에 톡 톡 넣어서 먹었다. 결혼식은 보통 3일을 했는데 첫날은 도새기 잡는 날, 두 번째 날은 가문잔치(혼례를 치르는 전날 벌이는 잔치)로 손님을 받았고, 셋째날은 결혼 당일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이었다.
신부상이 차려지면 동네아이들이 신부가 주는 밥 한술을 얻어먹으려고 신부상 주변에 메달려 있었다. 재수 좋으면 계란 하나쯤 얻어먹을 수 있었다. 결혼 할 때 신랑집이 좀 사는 집이면 신랑 형제지간이 신부에게 옷 한 벌 정도 해주었다. 이것이 예물의 전부였다.
어릴 때는 물도 참 귀했다.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냇물을 떠다 먹었는데 냇물도 맨 위쪽은 먹는물, 중간은 빨래하는 물, 맨 밑에는 목욕하는 물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물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게 신기할 정도였다.
* 자료조사 팀 : 문미선, 송동숙, 나임순, 이은숙, 김정아, 양명심, 김영숙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영장나면 공정을 잘 챙겨사했주.
영장나면 공정을 잘 챙겨사했주.
 •강원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향토음식연구회
•강원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시향토음식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