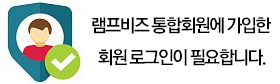1936년 7월 울산 달리가 시끌벅적해졌다. 달리는 논과 농가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40여 명에 달하는조사원들이 마을 곳곳을 다녔다. 1936년 7월 중순부터 3주 동안 진행된 위생 조사 때문이었다. 이후 이 내용은『조선의 농촌 위생』이라는 제목으로 책으로 발간 된다.
부제는 ‘경상남도 울산읍 달리의 사회위생학적 조사’였다. 이 자료는 1936년 울산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달리는 지금은 울산 최대 번화가인 달동이다. 하지만 1936년 달리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
포플러 가로수가 길가에 이어지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며, 콩잎이 흔들거리고 있는 완만한 구릉 너머로 버섯 모양을 한 초가지붕들이 눈에 보이는 곳83)
한 편의 영화를 연상시키는 서정적인 풍경이다. 버섯 모양의 초가지붕에서 살던 1936년 울산 달리 사람들의 여름 밥상이 궁금해진다.
♣ 달리의 여름 삼시 세끼
조사원들은 많은 질문을 던진다. 삼시 세끼를 먹었는지, 그렇다면 어떤 반찬을 먹었는지. 그것을 먹는 방식은 어떠했는지. 하물며 밥의 양은 어땠는지, 그릇의 크기는 또 어떠했는지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중 가장 궁금한 점은 그들이 삼시 세끼를 먹었는가 하는 점이다.
먹을 것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일은 예사였다. 오죽했으면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말이 될 정도였다. 하루 두 끼만 먹고 살았던 눈물겨운 이야기가 많다. 다행스럽게도 울산 달리 사람들은 삼시 세끼를 먹고 있다.
반찬 수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지만 분명 점심까지 챙겨 먹고 있었다. 조사원들은 달리를 각 집을 찾아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들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눠 계층별 삼시 세끼에 주목했다. 달동 사람들의 음식 재료, 요리법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 조사 막간 혹은 점심에 식사하는 조사원과 현지인의 모습
2014년 울산박물관에서 나온 자료인『울산과 달리』에는 조사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수록돼 있다. 사진의 제목은 '조사 막간 혹은 점심에 식사하는 조사원과 현지인의 모습’이다. 안주인으로 보이는 두 여인 앞에 앉은 흰 가운을 입은 조사원이 좁은 마루에 앉아있다.
조사원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다. 흰 사발에 담겼음을 짐작할 수 있는 감자 정도로 보인다. 사진 제목대로 한다면 식사를 하는 모습일 것이다. 이 사진은 부실한 식사 혹은 찾아온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대접쯤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밥상’이 보이지 않는다. 조사원들에게 마찬 가지였던 모양이다. 밥상의 유무, 밥상을 누가 쓰는가가 관심사였다. 밥상의 사용 여부를 통해 집안 권력을 추적해 보려고 했는지 상세히 기록해 두고 있다. 밥상은 한 집안의 호주와 장남이 썼다. 그 외는 사용하지 않는다.84)
밥상 없이 둥글게 모여 각각의 식판 앞에 음식을 놓고 먹는다.85) 식사준비를 하는 연료는 보리껍질과 솔잎, 솔가지이다. 울산에서는 마른 솔잎을 갈비라고 부른다. 울산에는 참갈비라는 말도 있다. 다른 낙엽은 섞이지 않은 솔가리를 말한다.86)
갈비는 지금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 처치 곤란이지만 예전에는 갈비를 끌어오는 경쟁이 치열했다. 모든 가정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중요한 연료로 쓰였기 때문이다.
이 갈비를 한가득 끌어 지게에 짊어지고 와서 부엌 한편에 쌓아두면 든든했다. 갈비는 화력이 부족한 보리껍질에 비해 화력이 좋았다. 불쏘시개로 갈비만을 연료로 쓰기도 했다. 가격은 10전 정도했다. 사온 갈비는 잘게 잘라서 밥을 하는데 사용했다.87)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달리의 삼시 세끼
달리의 삼시 세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