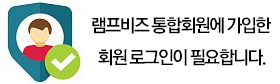배가 고프면 마음까지도 고파진다. 마음이 허전해도 배가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우가 적잖다. 보릿고개 앞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 먹는 반찬마저도 곱게 봐지지 않았다.
‘제발 아껴서, 조금씩만 먹어라.’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 리 없는 아들 때문에 속을 끓인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도 했다. 지나고 나니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가난한 살림에 많은 자식들의 끼니를 준비해야 하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핀잔이 었을 것이다. 너나없이 가난했던 그 시절 울산 사람들은 어떤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을까.
♣ 소도 안 먹는다는 콩잎을 사랑하는 울산 사람들
1952년 10월 12일『경향신문』에서 “콩잎 같은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참상”이라고 했을 만큼 콩잎은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었다. 콩잎과 함께 시락죽과 밥도 허기진 배를 채워 주었다.
시락밥, 죽시래기를 넣은 밥으로 도시락을 싸 가면 밥이 파랗게 된다. 이것이 부끄러워 숨겨서 먹었다고 한다.163) 시락밥을 많이 먹어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을 정도였다. 그래도 시락밥은 시락죽보다 양호했다. 시락죽을 더 많이 먹었다.
그마저도 배불리 먹기 어려웠다. 시락죽은 지독한 가난의 다른 이름으로 여겨졌다. 지금은 시락죽과 콩잎을 두고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콩잎을 영혼과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콩잎은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한다.
그 가난했던 시절, 콩잎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피치 못할 자구책이었는지 영양을 고려한 식단구성이었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콩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다.
콩은 된장, 간장 등 각종 장을 먹들고, 콩잎으로는 다양한 반찬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 한국은 지역별로 음식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르다.
재료뿐만 아니라 요리법도 다르다. 울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콩잎’은 충청도와 경기, 서울에서는 먹지 않는 음식이다. 가을철 충청도 지역에서 쓸모없이 말라가는 콩잎을 보면 울산 사람들의 애간장은 타들어간다.
▲ 콩잎
‘저 아까운 콩잎을 저렇게 버리다니!’
콩잎에 대한 호불호는 어떻게 길들여졌는가와 연결된다. 얼마 전 콩잎에서 ‘비린 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콩잎을 두고 맛을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콩잎은 맛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맛이 있다’라는 이미지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이 차이가 한 지역의 문화이다. 콩잎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입맛이 된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입맛이 모여 한 집단과 도시, 사회의 맛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울산다움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때문에 음식은 한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지역과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다. 울산 사람들은 콩잎을 사랑한다. 그런 울산 사람들을 보면서 소도 안 먹는 콩잎을 먹는다는 우스개를 하기도 한다. 소도 안 먹는다는 콩잎을 우리는 왜 이토록 사랑하는가.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콩잎을 사랑하는 울산 사람들
콩잎을 사랑하는 울산 사람들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