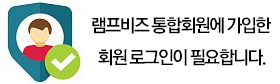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이방인의 시선으로 보면 큰 충격 일 수도 있다.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는 울산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1936년 울산의 달리의 조사를 나온 일본인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울산의 달리로 위생 조사를 하던 조사원은 달리의 밥상에 올라있는 ‘희고 탁한 것’에 대해 궁금해 한다.
그녀는 바로 부엌으로 갔는데 잠시 후 T군 앞에 올린 것은 성냥으로 보기에는 모양도 다르고 발화기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기로 ‘사바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바리’ 안에는 반찌꺼기 같은 것이 떠 있는 희고 약간 탁한 더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냥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T군은 잠시 멍하게 그것음 바라보고 있다가 결심을 한 모양으로 심각한 엄굴로 ‘사바리’름 박아 그루에 가득 들어 있뉴 희고 탁한 그것을 마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바리’에 담아서 장부인이 T군의 면전에 내놓은 것은 밥을 지은 후 솥에 부은 더운물입니다.
그것을 ‘숭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조선에서는 내지처럼 차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던가? 하물며 시골에서는 여름에는 거의 물을 마시고 숭늉을 약간 마시는 정도이며, 농가의 약간 상류가정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보리차를 마시기도 합니다.152)
‘희고 탁한 그것!’의 정체는 숭늉이다. 숭늉은 밥을 지은 솥에서 밥을 퍼내고 물을 부어 데운 물을 말한다. 숭늉을 먹지만 녹차와 같은 차를 마시지 않는 울산의 음식 문화를 지적한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음식 문화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밥을 지은 후 솥에 부은 더운물’이라는 설명이 재미있다. 울산 사람들에게 숭늉은 입가심을 하는 훌륭한 후식이었다. 곡물로 지은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 짠맛의 반찬을 먹는 한국인에게 숭늉은 식사 후 입안을 개운하게 해 주는 입가심 음료 역할을 했다.153)
밥찌꺼기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썼던 그에게 숭늉이 어떤 맛이었을지 궁금하다. 위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숭늉은 “밥찌꺼기 같은 것이 떠 있는 희고 탁한 더운 물”처럼 시각적으로는 식욕을 자극하지 못한다. 하지만 구수한 맛이 입을 행복하게 한다.
울산에는 시집간 딸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숭늉을 마신다는 이야기가 있다.154) 매일 식사 준비를 하면서 딸을 그리워했던 부모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전기밥솥이 보급되면서 구수한 숭늉이 식탁에서 사라지고 있다. 숭늉을 능가하는 구수한 맛을 자랑하는 것도 있다.
바로 ‘뜨물국’이다. 그래서 숭늉보다 뜨물이 구수하고 맛있다는 사람도 적잖다. 뜨물은 쌀을 씻어내 뿌옇게 된 물을 말한다. 지금은 쌀을 씻는 과정에 나온 부산물로 버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 었지만 예전에는 뜨물도 데워서 먹었다.
숭늉을 끓일 때 뜨물을 넣으면 더 구수했다. 숭늉과 뜨물은 쌀 한 톨이라도 귀했던 시대를 보여주는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다.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KFA(K-Food Archive) 약 100만여개 Big Data Project






 통합검색
통합검색









 숭늉과 뜨물국
숭늉과 뜨물국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우리음식연구회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